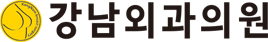원장칼럼
| 제목 | 전이의 발병기전 | 2022-12-03 |
|---|---|---|
|
https://blog.naver.com/gogngs/222944716609
일반적으로 다세포 생물의 세포들은 서로 협력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지만 , 암에서는 세포와 장기간의 협조적인 상호작용이 되지 않음으로써 기능부전이 발생하고 전문화된 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발생한다. 암세포는 진화재연성에 있어 정상세포에 비해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 자연변이성과 자연도태를 이용해 생존경쟁을 한다. 암세포가 전이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종양과 숙주의 상호작용에 의해 침윤-전이 일련과정으로 진행되며 , 이는 7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단계는 암세포가 세포의 기저막에 유착되어 림프계통이나 혈액계통을 타고 이동하면서 전반적인 순환을 통해 먼 곳으로 이동해 나간다. 이후 원하는 곳에 도달하면 결합조직을 파괴하고 미세전이를 형성하며 마지막 단계로 군집화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정상 유관은 상피세포와 근육상피세포의 두 세포층으로 이루어지며 , 이들은 기저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기저막의 침윤은 상피내암과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침윤성 유방암 간의 차이점이며 , 침윤성 유방암의 경우 원발종양의 크기에 관계없이 침윤을 일으킬수 있는 능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원발종양의 침윤은 기저막 유착과 기저막의 국소적인 단백용해 , 기저막과 세포외 기질사이의 이동을 통해 진행된다. 원발종양이 성장함에 따라 혈애공급을 위해 신생혈관이 생겨나며 , 암세포가 원발종양의 경계부를 이동하여 기저막을 뚫고 주위 조직으로 침윤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혈관속으로 침투하게 되며 , 순환기 내 생존 하여 전신순환이 가능하며, 이에 원격장기 내 정지함으로써 혈관에서 주위 조직으로 유출이 일어나며 새로운 조직 내에 생존하게 된다. 이때 암세포의 성장등의 과정을 거쳐 전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이과정에는 암유전자, 세포-세포, 세포-세포 외 기질 간의 부착, 단백질분해효소, 암억제유전자 등이 관여하여 , 일부 암세포들은 원발종양으로부터 쉽게 이탈할 수 있도록 응집성물질의 생산을 줄여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암세포는 림프계로 침투하여 정맥류로 유입되거나 혈관 속으로 직접 침투 할 수 있다. 또한 , 침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혈관 내막세포에 암세포가 탐식되어 순환기계로 유입되는 것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암세포는 순환기계로 유입되면 혈류의 물리적 손상을 극복하고 인체의 면역 기전도 피해야 혈액을 타고 순환이 가능하게 된다. 암세포들은 전이 과정의 각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사용한다. 암세포가 원격 부위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혈관신생이 필요하고 ,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집락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미세환경과 주변분비신호같은 인자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세포자멸사가 원격 부위의 집락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방암의 전이는 신속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원발암 치료 후 10~20년 뒤에도 발생할 수 있다. 암세포들은 전이 과정상의 여러 시점에서 자극을 받거나 반대로 휴면기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생체 내에서 단일 휴면세포는 알기 힘들며 , 종양의 휴면에 관한 연구는 기술적으로도 어렵다. 전이과정 중 혈관신생 이전 단계에서는 암세포의 증식과 세포자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균형이 Bcl-xL 항세포자멸사 유전자의 과발현으로 인해 깨지게 되면 휴면 중인 암세포가 활성화된다. 휴면 암세포의 또 다른 유형은 전이 부위에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분열하지 않고 있는 세포들로서 Naumov 등(2002) 은 유방암 생쥐모델에서 비유전체적 세포표지자 방법을 이용하여 이 세포들을 생쥐에 주입했을 때 종양이 형성된다고 보고 했다. 아직까지는 휴면을 개시하고 종결하는 신호전달경로를 잘 알지 못하며, 전이 부위의 휴면 암세포들이 표준적인 항암화학요법이나 새로운 분자 생물학적인 표적치료에 반응하는지도 아직 분명치 않다. 새로운 장기로 전이된 암세포는 원발종양의 전이능력보다 훨씬 강해지는 것을 여러 실험을 통해 알려져 있다. 전이된 암세포 또한 다시 다른 곳으로 전이될 수 있는 근원이며 이를 전이의 전이 현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다세포 생물의 세포들은 서로 협력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지만 , 암에서는 세포와 장기간의 협조적인 상호작용이 되지 않음으로써 기능부전이 발생하고 전문화된 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발생한다. 암세포는 진화재연성에 있어 정상세포에 비해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 자연변이성과 자연도태를 이용해 생존경쟁을 한다. 암세포가 전이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종양과 숙주의 상호작용에 의해 침윤-전이 일련과정으로 진행되며 , 이는 7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단계는 암세포가 세포의 기저막에 유착되어 림프계통이나 혈액계통을 타고 이동하면서 전반적인 순환을 통해 먼 곳으로 이동해 나간다. 이후 원하는 곳에 도달하면 결합조직을 파괴하고 미세전이를 형성하며 마지막 단계로 군집화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정상 유관은 상피세포와 근육상피세포의 두 세포층으로 이루어지며 , 이들은 기저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기저막의 침윤은 상피내암과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침윤성 유방암 간의 차이점이며 , 침윤성 유방암의 경우 원발종양의 크기에 관계없이 침윤을 일으킬수 있는 능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원발종양의 침윤은 기저막 유착과 기저막의 국소적인 단백용해 , 기저막과 세포외 기질사이의 이동을 통해 진행된다. 원발종양이 성장함에 따라 혈애공급을 위해 신생혈관이 생겨나며 , 암세포가 원발종양의 경계부를 이동하여 기저막을 뚫고 주위 조직으로 침윤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혈관속으로 침투하게 되며 , 순환기 내 생존 하여 전신순환이 가능하며, 이에 원격장기 내 정지함으로써 혈관에서 주위 조직으로 유출이 일어나며 새로운 조직 내에 생존하게 된다. 이때 암세포의 성장등의 과정을 거쳐 전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이과정에는 암유전자, 세포-세포, 세포-세포 외 기질 간의 부착, 단백질분해효소, 암억제유전자 등이 관여하여 , 일부 암세포들은 원발종양으로부터 쉽게 이탈할 수 있도록 응집성물질의 생산을 줄여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암세포는 림프계로 침투하여 정맥류로 유입되거나 혈관 속으로 직접 침투 할 수 있다. 또한 , 침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혈관 내막세포에 암세포가 탐식되어 순환기계로 유입되는 것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암세포는 순환기계로 유입되면 혈류의 물리적 손상을 극복하고 인체의 면역 기전도 피해야 혈액을 타고 순환이 가능하게 된다. 암세포들은 전이 과정의 각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사용한다. 암세포가 원격 부위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혈관신생이 필요하고 ,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집락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미세환경과 주변분비신호같은 인자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세포자멸사가 원격 부위의 집락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방암의 전이는 신속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원발암 치료 후 10~20년 뒤에도 발생할 수 있다. 암세포들은 전이 과정상의 여러 시점에서 자극을 받거나 반대로 휴면기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생체 내에서 단일 휴면세포는 알기 힘들며 , 종양의 휴면에 관한 연구는 기술적으로도 어렵다. 전이과정 중 혈관신생 이전 단계에서는 암세포의 증식과 세포자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균형이 Bcl-xL 항세포자멸사 유전자의 과발현으로 인해 깨지게 되면 휴면 중인 암세포가 활성화된다. 휴면 암세포의 또 다른 유형은 전이 부위에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분열하지 않고 있는 세포들로서 Naumov 등(2002) 은 유방암 생쥐모델에서 비유전체적 세포표지자 방법을 이용하여 이 세포들을 생쥐에 주입했을 때 종양이 형성된다고 보고 했다. 아직까지는 휴면을 개시하고 종결하는 신호전달경로를 잘 알지 못하며, 전이 부위의 휴면 암세포들이 표준적인 항암화학요법이나 새로운 분자 생물학적인 표적치료에 반응하는지도 아직 분명치 않다. 새로운 장기로 전이된 암세포는 원발종양의 전이능력보다 훨씬 강해지는 것을 여러 실험을 통해 알려져 있다. 전이된 암세포 또한 다시 다른 곳으로 전이될 수 있는 근원이며 이를 전이의 전이 현상이라고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