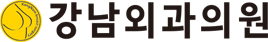원장칼럼
| 제목 | 유방 종물의 진단 체계 | 2022-02-11 |
|---|---|---|
|
https://blog.naver.com/gogngs/222644853960
유방 종물은 증상을 유발하는 유방 질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증상 중의 하나이다. 유방 종물의 10% 정도는 유방암으로 진단되므로 젊은 나이 , 남성, 암의 가족력 같은 위험 요소가 없다고 하여 유방 종물에 대한 평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비정상적인 유방종물은 3차원적인 모양으로 주위 조직과는 분명히 구별되며, 반대쪽 유방과 비대칭이고 , 월경 주기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유방 종물의 진단 순서는 환자의 연령과 폐경 상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악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때까지 평가해야 하며, 보다 정확한 진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유방 종물로 내원한 환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병력을 청취하는 것이 첫번째로 시행되어야 한다. 생리주기와 관련된 변화, 최근의 외상 유무, 다른 증상의 동반 여부 ( 통증 , 피부 또는 유두의 변화, 유두분비물, 발적 등 ) , 가족력 , 산부인과적 질환, 유방에 대한 과거 검사 ( 유방촬영술, 초음파, MRI등 ) 을 확인한다 과거에 유방에 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양성이라고 하는 것보다 비정형 증식 또는 소엽내암 같이 조직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신체 검진은 어떠한 영상 검사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30세 이전의 환자 중 자가 검진으로 유방 종물이 발견되어 벼원을 방문한 80% 에서 53%만이 실제 유방 종물이 관찰되었다. 정상 유방 조직의 변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방의 비후가 촉지되거나 폐경전의 여성이면, 정상적인 유선조직이 단단한 종물로 만져지는 경우도 많고, 늑골이나 늑연골접합부, 돌출된 지방엽등의 정상 구조물이 유방 종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 악성이 의심되는 종물은 딱딱하고 , 움직이지 않으며 주변 유방조직이나 피부에 고정된 소견 (피부함몰, 유두함몰) 과 불분명한 변연을 가지고 있다 양성 종괴는 유동적이며, 부드럽고 잘 경계된 변연을 가지고 있다. 병력과 신체 검진을 시행하였다면 환자는 ㄱ. 비정상 없음, ㄴ.유방 비후, ㄷ. 임상적으로 양성 종물 , ㄹ. 임상적으로 악성 종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상 검사를 통하여 악성이 의심되면 조직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영상 검사의 경우 임신한 여성과 매우 젊은 여성을 제외하고는 유방촬영술을 먼저 시행한다. 유방촬영술은 비정상 유방을 평가하는데 아직까지 표준으로 남아 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측 유방촬영을 시행하였다면 동측의 유방촬영만을 시행하고 이전에 시행한 유방촬영 영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로의 차이를 비교한다. 최근 유방촬영술에서 음서이었던 경우, 1년 이내에 새로운 촉지성 종물이 발견되었다면 유방 촬영술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표적성 유방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정상 유방촬영소견이 악성을 배제하는데 충분치 않으며 촉지성 유방암 환자의 약 13% 에서 정상 유방촬영 소견을 보였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유방 초음파는 임신중, 수유중 또는 30세 이전의 여성에서는 기본적인 영상 기법이 되며 , 40세 이상에서도 대부분 유방 촬영술에 이어 실시하면 암 발견율을 향상시킨다. 특히 유방 초음파는 유방 종물이 낭종 또는 고형 여부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며 , 종물 양상의 특징을 판단할 수 있다. 고형 종물은 양성 또는 악성 으로 , 낭종은 단순 또는 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방촬영술과 초음파상에서 보이지 않는 촉지되는 유방 종물의 경우, 촉지한 상태에서 세침 흡입 검사를 시행하면 진단율을 높일 수 있다. 자기공명 영상은 높은 위양성율과 낮은 특이도로 촉지성 증상을 평가하는 적절한 영상진단법은 아니다. 그러나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상에서 병변이 보이지 않지만 의심스러운 임상양을 가진 특수한 경우에서 흉터와 재발을 감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침흡인검사는 1930년 도입된 이래 촉지성 종물의 진단에 유용하게 이용되어 왔고 65~98% 민감도, 34~100 % 특이도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제한점은 적절한 진단을 어렵게 하는 불충분한 검체와 침윤성 병변의 존재를 배제할수 없으며, 세분류할수 있는 조직학적 구조를 얻기 힘들고 과오종 등 일부 종물의 진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중심침생검술은 세침검사에 비해 더 많은 조직을 획득하여 병리학적 세분류를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조직학적 구조물을 제공하고 침윤의 존재도 쉽게 진단 할 수 있다. 절제 생검에 비해 덜 섬뜩 하면서 일치율은 90% 에 이르고 위음성률은 1% 정도로 보고 되어 현재 유방종물의 평가에 있어 기본 검사법으로 존재한다. 절개생검은 최근 들어 거의 시행되지 않으며 절제 생검 역시 침생검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나 영상검사 및 기타 검사 결과가 일치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경우, 비정형과 같은 고위험 병변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종물의 초기 진단법이 아니다. |
||